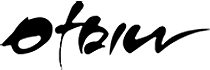❤내 젊은 날의 고해성사 - 3부❤️
작성자 정보
- 무료야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목록
본문
.. 수업이 끝나고 나는
실기실 문 앞에서 괜히 시간을 끌면서 그녀를 기다렸다.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같이 나오면서
말을 걸기로 했다.
그 동안 그녀를 관심 있게 지켜본 바로는
아직 절친한 친구를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여학생들은 꼭
서너 명이 몰려다녔는데
아직은 그녀가 속한 그룹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대개 여학생들은 출신 여고별로,
아니면 출신 미술학원 별로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오전 실기수업이 끝나고
1시간 뒤에는 채플이 있는 날이었다.
난 종교가 없었는데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어서
채플수업이 있었다.
"다음 채플이지?"
"...."
"점심 어디서 먹어?"
"...."
"학생회관?"
"...."
"정문 앞에 가서 떡라면이나 먹을까?
내가 사 줄께 응?"
"...."
"짜식이 왜 대답 안 해 임마!!
가자 어서.."
그제야 웃으며 날 올려다보았다.
빼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큰 눈에다 수수하게 생긴 아이.
.... 스무 살 짜리.....
.... 금방
여고를 졸업한 스무 살 짜리.
풋풋한 수줍음을 아직도 눈썹 끝에
매달고 있는 아이.
....
정문을 나서는 길에서 마주치는 많은 학생들.
저마다
새 학기의 설렘과 흥분을 안은 채
또는 그녀처럼 막 시작하는 대학생활의 감격을
다듬질하는 얼굴로
그렇게 삼삼오오
올라오고 내려가고 있었다.
교문 앞부터 즐비하게 올려다 붙은 현수막들.
그 현수막만큼이나 줄지어 늘어서 있는 분식점들.
화방, 문방구,
그 앞 복사기 앞에 모여있는 학생들...
그 큰길에서도 상급생을 향해 부동자세로 <충! 성!> 거수 경례 하는 ROTC 들.
그 풍경 속에 속해있다는 것.
....정말 좋았다.
.....
우리는 정문 큰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성주분식>으로 갔다.
떡라면과 김밥 한 줄을 시켰다.
"이름이 정희지?"
알고 있으면서 괜히,
너스레를 떨었다.
"형은 신기해예"
"...? 뭐가?"
"호 호 호.."
"뭐가 신기한데?"
"아, 라면 나왔다.
나중에 얘기해 줄께예"
그녀는 젓가락을 거의
X 자로 들고서 먼저 나온 단무지를 집고 있었다.
"참, 너도...
그 젓가락질로 라면 어떻게 먹어?"
"생각보다 잘 먹어예"
아닌게 아니라 그랬다.
....
분식집에서 나오면서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있잖아,
우리 수업 빼먹자 응?"
"..."
"채플 지겹잖아?
너 교회 다녀?"
"아니예"
"놀러가자. 아무 데나..."
"어디로 갈라고예?"
"일단 버스정류장에 가서
결정하지 뭐."
우리는 버스정류장에서 먼저 오는 버스를 타기로 했다.
학교 앞을 지나는 버스는 교외로 가는 것이 많았다.
30 번 버스가 먼저 왔다.
<하양>이라는 곳으로 가는 버스였다.
가본 적은 없었지만
경산 부근의 교외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여간 가다가 좋은 곳이 나오면 내리기로 했다.
처음엔 자리가 없었지만,
시내를 벗어나면서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났다.
우리는 둘이 나란히 앉아서는
이따금씩 차창 밖을 유심히 내다보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1시간 반 이상 걸려서
들판이 보이는 한적한 작은 시골마을에서 내렸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달리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면 좋은 곳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골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우리는 들판을 향해서 천천히 걸었다.
마을의 어귀를 돌아서,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는 시골길을 지나자 곧바로 들판이었다.
먼저 작은 개천이 얕은 제방을 끼고 풀어져 있고
들판으로 흐르는 물치고는 비교적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수면을 따라
아직 채 익지 않은 서너 줌 봄바람이
은빛으로 잔물결을 내고 있었다.
....
아아.
그리고 그 바람결에 눕는 보리밭.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내 고향 같은 풍경.
초봄의 오후 햇살을 받은 들풀들.
... 이름 모를 풀꽃들...
그 몽우리들이...
.... 그 사이로
쪼르륵 쪼르륵 날아다니는 새들.
.... 가물거리는 아지랑이,
넘실거리는 나비들.
그 풍경이란.
.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밝은 피아노 협주곡의 선율이라고 할까.
봄의 들판은 그렇게
우리들의 밀어를 싣고서 넘실거리고 있었다.
정말... 그 풍경들 모두가
아직은 채 익지 않은
우리들의 밀어를 그윽한 눈길로 반겨주는 듯 했다.
거기에 흠씬 동화되어
그녀 마음도 봄바람처럼 풀어져서 인지...
그 들판을 거닐면서 줄곧 그녀도,
밝은 표정으로 시시콜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너 아까 참,
나더러 신기하다며? 그게 뭔 얘기야?"
"있잖아예... 예비소집 날예..."
"예비소집? 본고사 예비소집?"
"그때요, 저, 형 봤어요.
바바리에다 도리구찌 모자 썼죠?"
"어? 그때 날 봤다고?"
"호 호 호...
무슨 시험 칠 사람이 저 카고 왔을까 순 날라리같이.."
"너? 이 짜식이..."
"오리엔테이션 때 속으로 막 웃었는데
어, 저 날라리도 합격..."
"얘가 아주!!"
.
그랬다.
그 순간 난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이어서 곧 그녀의 체온이 내 가슴으로 따스하게 전해져 왔다.
그래, 얘도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예비소집 때, 그 모습이 튀었었던가?
... 속으로 나도 한참 웃었다.
그땐 군대서 제대한지 겨우 4일 뒤였다.
머리가 짧아서 모자를 썼고,
도리구찌 모자가 아니라 <위대한 갯츠비> 라는 영화에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썼던 모자랑 비슷한 건데...
하여간 그래서
그녀가 나를 눈여겨봤다니 나쁘진 않았군, 했다.
...
어느 샌가
해거름이 무리져 내려서 주위가 어둑어둑 해졌다.
우리는 서둘러 버스정류장이 있을만한 작은 읍내로 들어갔다.
내렸던 곳과는 반대쪽인 것 같았다.
둘 다 배가 고팠으므로 우리는 거기서 소박한 저녁을 사먹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더 다정스러웠다.
그녀의 집은 범어동 이었다.
이미 시간이 꽤 늦었으므로 나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왔다.
..
사실.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타인들의 일상이 정겹고
밤늦은 시간에도 저마다의 생업에 열심인 사람들의 모습들도.
너무나 소담스러웠다.
그리고,
금방 헤어졌는데.....
..... 금방 또
그녀가....
보고 싶었다.
<다음에 계속...>
야설나라 - 무료야설 NTR/경험담/SM/그룹/근친/로맨스 무료보기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