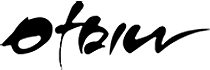❤내 젊은 날의 고해성사 - 18부❤️
작성자 정보
- 무료야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 조회
- 목록
본문
그 6 월,
정희가 돌아왔다.
정희가 다시 내게 돌아온다면...
< 돌아 오라! 다리 위에
그 여자 만일 돌아온다면...
나는 아아...
기쁘다라고...
그러면 녹 쓴 은촛대를 다시 꺼내
반짝반짝 닦은 뒤
촛불을 훤히 밝히리라... >
...
그 무렵 나는 무슨 시집에선가
아니면 누구의 수필집에선가 읽은 글귀를 외우고 있었다.
돌아 오라 다리 위에,
녹 쓴 은촛대를 다시 꺼내... 그녀를 위해 불을 밝힌다.
....
"저녁 맛있게 해 줄게"
"저녁예?"
나는 마음이 들뜬 나머지 괜히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는 길에 정희를 데리고 시장에 들려서
몇 가지 밑반찬과 내가 제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쇠고기 스프를 사고 거기에 넣을 감자를 샀다.
화실이래야 조그마해서 그렇고 그렇지만
정희를 데리고 가서 오붓이 있을 수 있다니
좋았다.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았다.
서울의 상미가 내려와서 날 흔들어 놓고 간지 얼마 안되어서
형언키 힘든 아쉬움이 앙금처럼 가슴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정희가 내게 돌아 와주니 얼마나 좋은가.
내 할머니 말씀처럼 누군가가 정말로 날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
할머니는 내게 늘 그러셨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동지 샘으로 제일 먼저 가서
밤새 깨끗하게 고여있던 물 한 동이 이고 오셔서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다음으로 나를 맡기셨다고 하셨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든든히 가져도 된다고 하셨다.
그래,
방학 때에는 고향으로 정희를 데리고 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더웠지만 석유곤로를 켜서 밥솥에다가는 밥을 안치고
야외가스레인지 위엔 냄비를 올려 쇠고기 스프를 맛있게 만들고,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검소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 사이 정희는 내 침대에 걸터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저녁 준비를 하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와~ 형 제법이네? 스프부터 먹어야지...
어, 감자가 그래도 다 익었네? 걱정했는데..."
"그럼, 감자부터 먼저 익히고 그 담에 스프 넣지?"
그뿐만 아니라 타지 않도록 계속 숟가락으로 저어줘야 했는데,
내 딴에는 공들여 만든 거라는 걸 알까.
정희는 스프는 맛있게 먹더니
밥은 반찬이 없어서 그런지 들다 말았다.
그래도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내가 한다며 말렸다.
..
나중에...
이렇게 송알송알 저 녀석과 살 수 있다면...
식탁에서 커피를 한잔씩 한 뒤에 우리는 침대에 걸터앉았다.
나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정희도 가끔씩 따라 부르기도 했다.
"바빠빠빠~~
그대 슬픈 밤에는 등불을 켜요 고요히 타오르는 장미의 눈물
하얀 외로움에 그대 불을 밝히고 회상의 먼바다에 그대 배를 띄워요
~~~~ "
이 노래와 함께, 이승재의 아득히 먼 곳
권태수의 작은 연인들,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둘다섯의 일기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등...
그땐 그 노래들이 나의 18번이었다.
기타를 칠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다.
기타를 반주로 노래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겐 퍽 중요했다.
그건 어쩌면 내겐 <나르시스>, <카타르시스>라고 할까.
그런 의미였다.
..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저녁 해먹는데 시간을 너무 뺏겨서...
"형...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예."
"뭘? 아, 그래 뭐..."
"음... 나도 있잖아예... 마음이 아팠어예."
"그래... 그래도 학교에서 말고 따로 다른데서 가끔 만나면 되잖아?"
"... 그게... 아니라예... 형... 힘들어하지 말라고예...
그냥 앞으로도 그래라고예."
"..."
그랬다.
다시 내게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날 당장 그 순간에..
그날로 내게 돌아온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녁을 준비하면서
들떠 있었는데.
.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둘 다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뭐랄까 서서히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럼 오늘은 얘가 왜 여길 오자고 했나, 괘씸하기도 했다.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었다.
아니다.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는 항상 두 가지
양극의 지배자가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
선과 악,
양심과 비 양심.
지켜주고자 했는데...
지켜줘야 하는데...
젠장,
어차피 내 여자는 아닌 것 같으니까
헤치 워 버려?
그러면 오히려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지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것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했다.
"야! 그냥 여잔 맘에 들었다 하면 확 자빠뜨려
눌러서 도장 콱 찍어!!"
친구 녀석들 얘기처럼, 그렇게...
나는 그런 저런 생각으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희는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장난스럽게 날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참나,
이 자식이,
바로 그 웃음 때문에 내가 자극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웃음은 내가 비교적 쉽게 행동하도록 했다.
"너, 웃어 지금? 참나, 너, 이리 좀 와봐 봐"
"형! 왜 이래~"
나는 정희를 껴안았다.
하지만 정희는 완강히 거부했다.
"형!! 안돼!"
"너, 왜 웃었어? 자식아!! 응?"
"안 된다니까~"
"알았어, 이렇게 껴안고 가만 좀 있자 응? "
"안~ 돼!!"
정희를 침대로 쓰러뜨렸다.
얼마간 완강하게 거부하더니 그래도 키스는 받아주었다.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키스만은 허락하려고 했을까.
이제 가슴을 헤집었다.
양팔로 꽉 껴안은 채 가슴을 들춰 거기에 얼굴을 묻었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형! 형!! 안돼 그만!"
"알았어. 끝까지 안가면 되잖아. 끝까지는 안 갈게 응?
니가 생각하는 그건 안 할게 응?"
그건 거부하는 여자에게 항상 하는 거짓말이었다.
나는 정희의 청바지 단추를 억지로 풀고 자크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었다.
정희가 내 손을 잡고 버텼지만 말리지는 못했다.
그렇게 까지 마구 악을 쓰지는 않았다.
발정 난 수컷을 제어하기엔 힘에 부쳤을 것이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정희의 말랑말랑한 그곳을 만졌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정희의 몸 위로 완전히 올라탔다.
한 손으로는 가슴께와 정희의 두 손을 잡은 채
정희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점점.
나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
그때 정희가 그랬다.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려서
바로 겁탈직전이었는데,
정희가 그랬다.
"형!! 형!! 나 좋아하는 오빠 따로 있단 말야~~ 형!!
제발 응? 제발 응?"
"...."
<다음에 계속...>
야설나라 - 무료야설 NTR/경험담/SM/그룹/근친/로맨스 무료보기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