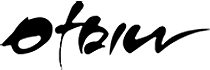❤빌어먹을 오빠. 사랑스러운 여동생. - 1부❤
작성자 정보
- 무료야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목록
본문
“이... 이러지 마세요...” “학생. 그러지 말고...” 슬며시 바지춤으로 들어오는 손. 현수는 주인아줌마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벽느낌. 현수는 양팔로 가슴을 가린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제발! 아주머님은 남편하고 아이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번만! 이번달 방세 빼줄게. 응?” “그런 말이! 읍! 으읍!!” 양팔을 붙잡고 덮치는 아줌마. 현수의 입은 아줌마의 입으로 막혔고 현수는 미친듯이 몸부림쳤다. 하지만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벌써 이틀째 물밖에 못마셨고 원래 기가 약한 몸이라 곧 아줌마에게 깔렸다. 아줌마는 능숙한 혀놀림으로 현수의 혼을 빼놓으며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옷을 벗어제끼더니 검은 브랜지어 차림으로 현수의 가슴위에 올라탓다. “이 이러지 마세요... 으음...” 현수의 얼굴을 덮는 검은 음모. 아줌마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핥아.....” “음! 음!”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발버둥쳤으나 힘은 없었고 숨은 막혀왔다. 현수는 울먹거리며 혀를내밀어 두툼한 주인집 아주머니의 붉은 속살을 핥았다. 할짝. 할짝. “으음... 더 세게.” 아주머니는 하체를 움직이며 현수의 얼굴에 보지를 마구 비볐고 검은 음모와 약간의 애액이 현수의 얼굴에 발라졌다.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조금씩 열심히 아줌마의 보지와 질내를 혀로 핥으며 빨았다. 이제 어느정도 본격적으로 되자 아줌마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혀를 내밀었다. 그리고 현수의 얇은 바지를 벗겨내릴려 했다. “안돼요! 정말... 제발.... 아앗!” 철썩! 주인집 아주머니의 손이 현수의 뺨을 갈겼고 현수의 고개는 돌려졌다. 아주머니는 현수의 목을 이리저리 씹었다. 현수는 아프기도 하고 괴로워해서 필사적으로 아줌마의 어깨를 붙잡고는 밀칠려 했다. “가만있어! 어차피 한번만 대주면 되는걸 가지고 웬 잔말이 이리 많아!!!” “흑... 흑... 제발...” “닥치란 말야! 어디 호스트바에서 놀다온 녀석 같은 주제에.... 한번만 대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것을... 그리고 어차피 이미 우린 즐겨본 사이잖아. 한번 한거 두 번하나 세 번하나 똑같은거 아냐?!!” “억지로 한거잖아요... 엉... 엉...” “닥쳐! 더 이상 지껄이면 당장 내쫓겠어! 돈도없는 가난뱅이 주제에 얼굴이 반반하면 그걸로라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 소리할거 없어! 더 이상 시끄럽게 굴면 내쫓아 버릴거야! 네 여동생과 같이 길거리에 내쫓기고 싶진 않겠지! 얌전히 있어!” “엉... 엉....” 현수는 팔로 얼굴을 가린체 울었고 현수의 우는 모습은 싫지 않았는지 아줌마는 우는 현수를 가만 놔둔체 바지를 벗겼다. 그리고는 약간 커진 현수의 육봉을 잡고는 한입에 쏘옥 너어버렸다. 쭙! 쭙! 쭙! 핥짝! 핥짝! “아흑! 엉엉... 그 그만... 아악!!!” 격렬하게 아줌마는 현수의 자지를 이리저리 빨고 핥으며 한손으로는 현수의 볼알을 이리저리 만졌고 또다른 손으로는 현수의 똥구멍을 비비거나 찌르며 현수를 괴롭혔다. 현수는 쾌락보다는 괴로운 얼굴로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아 아줌마! 제 제발 거기만은....! 거기만은!! 아악! 아악!!” 한동안의 현수의 비명소리와 자지를 빨고 애무하는 아줌마의 음란한 소리가 울리더니 곧 커다란 비명과도 같은 소리와 함께 현수의 몸은 크게 젖혀지며 경직榮? 한동안 경직 상태로 있던 현수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축늘어졌고 아줌마는 여전히 현수의 자지를 입에 문체 음란한 얼굴로 축 늘어진 현수를 바라봤다. “꿀꺽! 꿀꺽! 헤에-. 진하네.... 크크. 이렇게 많이 내보낸주제에 앙탈은... 하긴 너는 별로 여자를 밝히지 않는것 같던데 자위는 안하나 보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였나?” “...흑! ...흐흑....” “뭐 말하기 싫으면 상관없어. 내게 지금 필요한건 네 이 커다란 자지와 귀엽고 색기어린 네 얼굴이니까.... 몸도 부드럽고.” 현수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내려오는 손. 현수의 몸은 떨렸고 현수는 눈물을 흘리는 체로 팔로 얼굴을 가렸다. 현수의 몸을 쓰다듬던 손은 현수의 커다랗게 발기된 자지를 잡더니 능숙한 솜씨로 한번에 붉은 보지에 들어갔다. 조금의 지체없이 한번에! 현수의 하체는 크게 위로 솟구쳤고 아줌마는 아주 만족스럽고 황홀한 시선으로 입술을 핥으며 중얼거렸다. “바로 이거야... 이 크고 넓고 만족스러운 무게감! 아....” 철퍽! 철퍽! 철퍽! 아줌마의 달덩이와 같은 커다란 엉덩이가 위아래로 마구 움직였고 현수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흔들렸다. 아줌마는 얼굴을 가린 현수의 양팔을 위로 올리더니 현수의 얼굴을 음란함과 쾌락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현수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으나 쾌락과 황홀감에 불게 상기되이었다. 아줌마는 붉은 혀를 내밀어 현수의 입술을 핥았고 현수는 얼굴을 돌려 피했다. 굳이 혀에 키스하고 싶진 않았는지 아줌마는 현수의 눈과 귀 얼굴옆면을 마구 핥으며 쾌감에 미친듯이 몸을 떨었다. “허헉! 조 좋아!!!” 부르르르-. 이십분 정도 지나 아줌마는 쾌락성과 함께 뒤로 쓰러졌고 뒤로 쓰러지며 뽕하는 소리와 함께 아줌마의 보지와 현수의 자지도 빠졌다. 아줌마는 전신을 지배하는 쾌감에 아주 만족스러웠는지 입에 하얀 침줄기를 흘리며 멍한 표정으로 있었고 현수는 불만족스러웠는지 아시움이 담겨있었고 죄책감. 희한이 담긴 시선으로 누워있더니 곧 눈을 감고 몇줄기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곤 곧 아줌마로부터 떨어지더니 옷을 입고 옷매무세를 제대로 갖췄다. 그리고 옆방으로가 쭈그려 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린체 정신없이 울었다. “엉엉엉... 흐흑... 정말로... 더 이상은 싫어...” “...씨발. 이제 아주 개나소나 다 뜯어먹는구만.” 흠칫! 울고있던 현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무표정한 시선의 여동생 현린이 검은 정장의 차림으로 담배를 문체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오빠의 머리를 발로 차더니 조용히 말했다. “야. 궁상 그만 떨고 얼른 밥이나 차려와. 배고프다.” “흑.. 흑흑..” “남자새끼가 그만좀 울고. 밥차려오라고 안들리냐?” “차.. 차려올게....” “그년 내쫓았으니까. 울거면 네방에서 울어. 등신새끼....” 현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부엌에 들어가 남은 재료로 밥을 차렸다.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하얀쌀밥. 붉은 김치.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간 현수는 화들짝 놀라 밥상을 놨다. 여동생 현인이 약간 상기된 얼굴로 작은 책을 읽으며 청바지속에 손을 는체 신음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여동생은 한동안 손으로 보지쪽을 문지르더니 곧 싸늘한 시선으로 현수에게 말했다. “여동생 자위하는거 처음보냐? 등신새꺄? 얼른 안가지고 들어와?!” “미 미안...” 현수는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갔고 현린은 고맙다 않다 다른말없이 며칠 굶주린 사람마냥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는 미친듯이 먹어댓다. 곧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졌고 린은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며 현수쪽으로 트림했다. “꺼억~!!!” “........” “쩝! 등신새끼가 다른건 몰라도 밥하는 재주는 좋단 말야. 크크! 그러니가 데리고 살고 있는거지만....” “.........” “야! 가지마!” 막 밥상을 들고 나갈려는 현수를 현린은 제지했다. 현수가 의아한 시선으로 묻자 현린이 자기쪽으로 오게 하고는 들고있던 작은책을 현수머리쪽으로 던병? 책은 현수의 머리에 톡소리를 내며 부딪친뒤 떨어졌고 현수는 의아한 시선으로 책과 현린을 바라봤다. 현린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곧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읽으라고... 내가 그럼 못하러 책을 던별楣?” “으... 응.” 책을 읽고 읽으려던 현수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곤 고개를 숙이곤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고 여동생은 잠시 한쪽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한글 모르냐? 빨리 안읽어?!” “.........” 읽을수가 없었다. 책의 내용은 여동생과 오빠의 근친상간 이야기. 너무도 적나라게 표현된 애기와 내용에 도저히 읽을수가 없었다. 여동생은 잠시 아무말하지 않더니 곧 손짓을 했다. “榮? 병신아. 나가.” “..........” 현수는 눈에 눈물이 글렁인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현린은 잠시 눈을 가린 자세 그대로 가만 있더니 벽을 내리쳤다. 쾅!!!! “씨발....” 잠시 벽을 내리친 상태로 있던 현린은 쓰러지듯이 누었고 그리고 여전히 한쪽팔로 얼굴을 가린체 누었다. “개같은 새끼... 병신새끼... 빙신같은 새끼.... 귀여운 새끼.... 젠장...” 마지막말에 잠시 피식거린 현린은 곧 눈을 감고는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현수가 이불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현린의 몸위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고는 현린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은 없는것 같네... 잘자...” 작게 말한뒤 현린은 자리에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